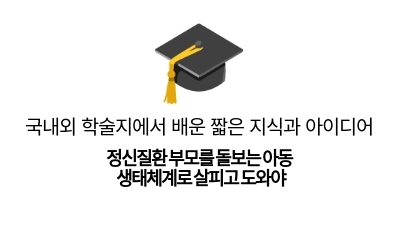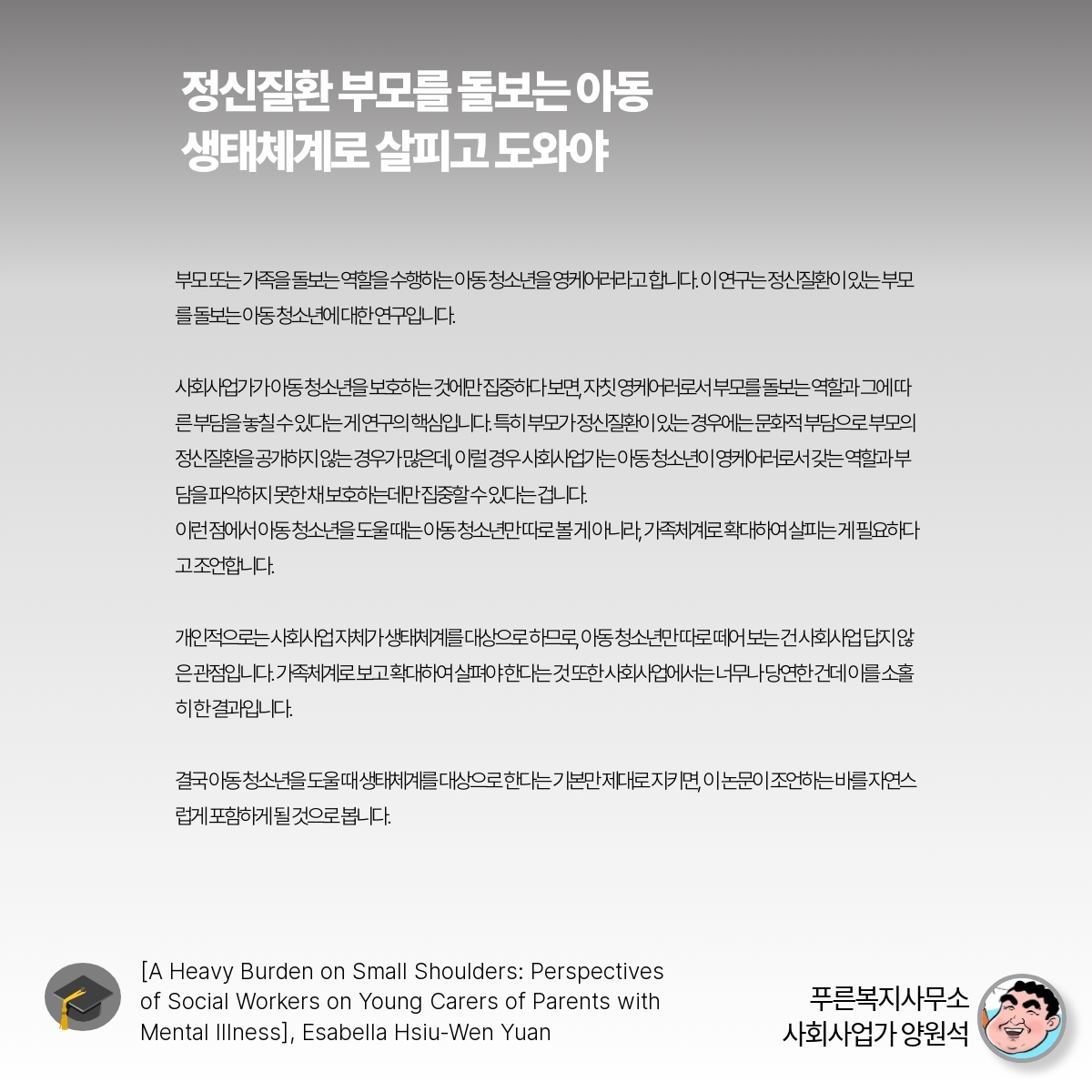
에디터 의견
부모 또는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 청소년을 영케어러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를 돌보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회사업가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영케어러로서 부모를 돌보는 역할과 그에 따른 부담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특히 부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적 부담으로 부모의 정신질환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사회사업가는 아동 청소년이 영케어러로서 갖는 역할과 부담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보호하는데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아동 청소년을 도울 때는 아동 청소년만 따로 볼 게 아니라, 가족체계로 확대하여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사업 자체가 생태체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아동 청소년만 따로 떼어 보는 건 사회사업 답지 않은 관점입니다. 가족체계로 보고 확대하여 살펴야 한다는 것 또한 사회사업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결국 아동 청소년을 도울 때 생태체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만 제대로 지키면, 이 논문이 조언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포함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AI 요약
이 논문은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를 돌보는 아동 청소년들, 즉 ‘Young Carers’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는 ‘돌봄 제공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아동복지 사회사업가 16명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현장 경험과 고민을 통해 이 아이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야기: 아이들이 가족의 돌봄을 짊어진다
사회사업가들은 정신질환 부모를 둔 아동들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동보호 관점에서 ‘위험 평가’에 집중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겪는 돌봄의 부담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겪는 고통이나 부담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비밀을 지키려고 하고, 부모를 보호하려는 책임감 때문에 혼자서 감당합니다. 어떤 아이는 응급상황에서 119 대신 친척에게 연락하기도 했고요. 그런 이유로 사회 안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문화적인 요인도 크다
대만(한국도 마찬가지겠죠)에서는 가족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큽니다. 부모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감추고, 아이에게 **“가족을 지켜야 해”**라는 기대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는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감정이나 욕구는 억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아이와 신뢰 관계를 만들고, 아이의 목소리를 듣자
단순히 보호대상아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어야 해요. 아이는 전문가가 아니라 ‘경험자’로서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가족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를 분리하거나 처벌하려고만 하면, 아이는 더 위축돼요. 가족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거기서 아이의 역할과 부담을 살펴야 해요.
돌봄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자
이 아이들은 단순히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삼아야 해요.
아동복지와 정신건강 서비스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면, 아이들은 그 틈에서 더 힘들어집니다. 정신질환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