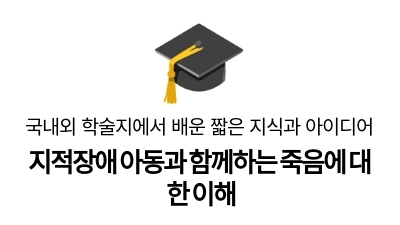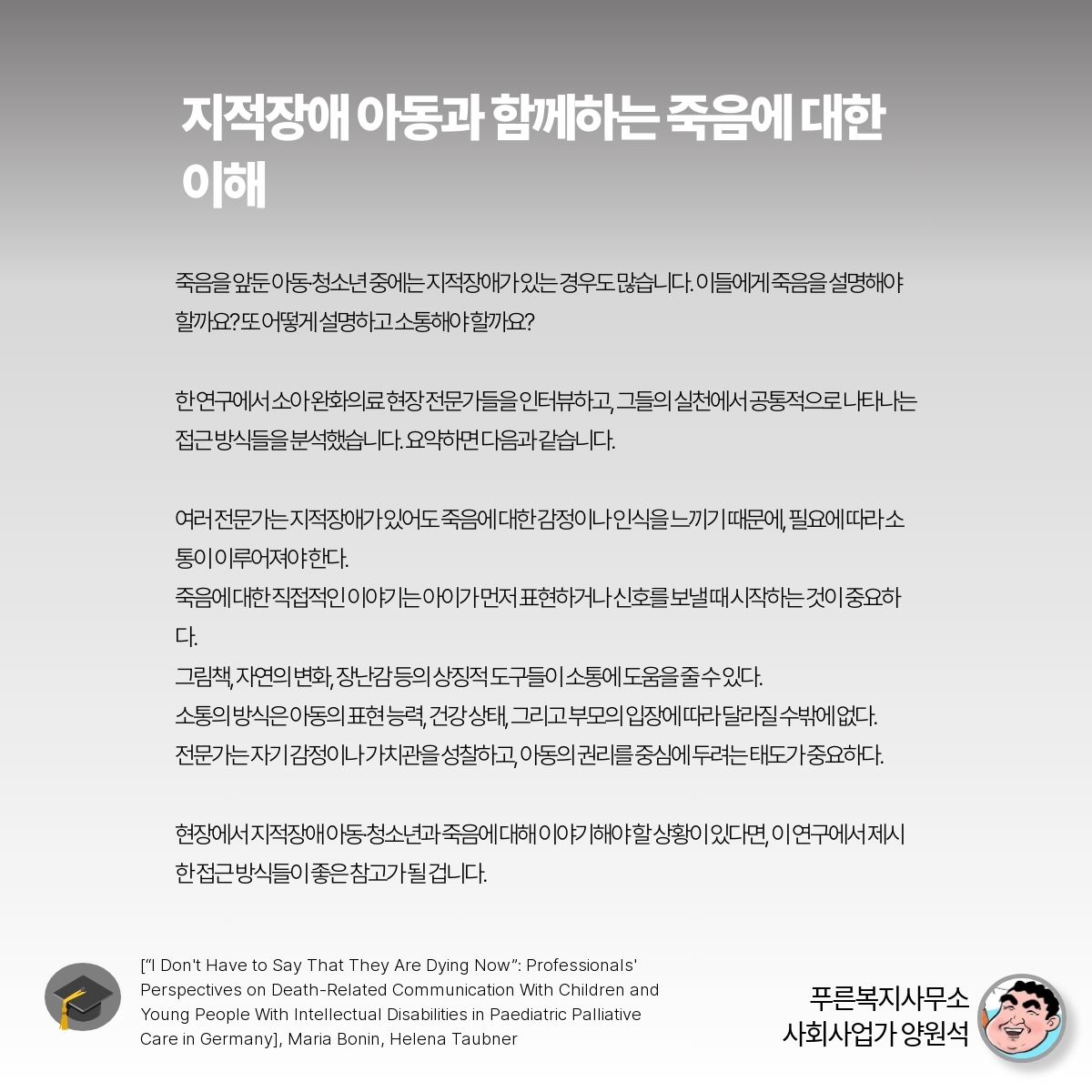
에디터 의견
죽음을 앞둔 아동·청소년 중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을 설명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설명하고 소통해야 할까요?
한 연구에서 소아 완화의료 현장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실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접근 방식들을 분석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는 지적장애가 있어도 죽음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을 느끼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이가 먼저 표현하거나 신호를 보낼 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책, 자연의 변화, 장난감 등의 상징적 도구들이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소통의 방식은 아동의 표현 능력, 건강 상태,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는 자기 감정이나 가치관을 성찰하고,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지적장애 아동·청소년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 방식들이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AI 요약
죽음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지적장애 아동·청소년과의 죽음 관련 소통에 대한 독일 소아 완화의료 전문가들의 관점
[이 논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소아 완화의료(pediatric palliative care)를 받는 아동·청소년들 중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죽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슬픔 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논문은 독일에서 소아 완화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7명을 인터뷰해, 이들이 지적장애 아동·청소년과 죽음에 대해 어떻게 소통하고 지원하는지를 살펴본 질적 연구입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하나, 소통 방식은 아이마다 다르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
아동의 장애 정도나 나이보다는,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현재의 건강 상태와 감정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봤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의 경우, 몸짓이나 눈빛, 놀이 등을 통해 아이의 의사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했어요.
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
전문가들은 먼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궁금해하거나 질문을 던질 때 그때 반응하며 도왔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자신이 죽으면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상상이나 믿음을 존중하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셋, 도움이 되는 도구들
그림책, 자연의 변화(예: 나뭇잎이 떨어지고 다시 피는 과정), 나비가 되는 애벌레 이야기 등을 활용했어요. 장난감 놀이, 만들기 활동을 통해 죽음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때로는 자신이 죽었을 때의 장례식이나 무덤을 스스로 상상하고 계획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넷,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경험이 도움이 되기도
형제자매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음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이 아이가 죽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봤습니다.
다섯, 부모의 입장이 중요하게 작용
어떤 부모는 아이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어떤 부모는 자신이 말할 용기가 없으니 전문가가 대신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마다 부모와 조율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여섯, 전문가 자신의 태도와 믿음도 중요
어떤 전문가는 지적장애 아동도 죽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이런 믿음이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해줄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