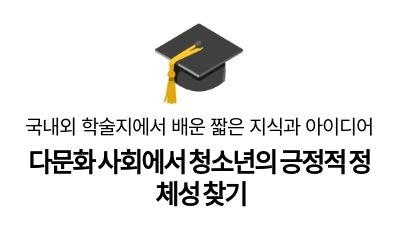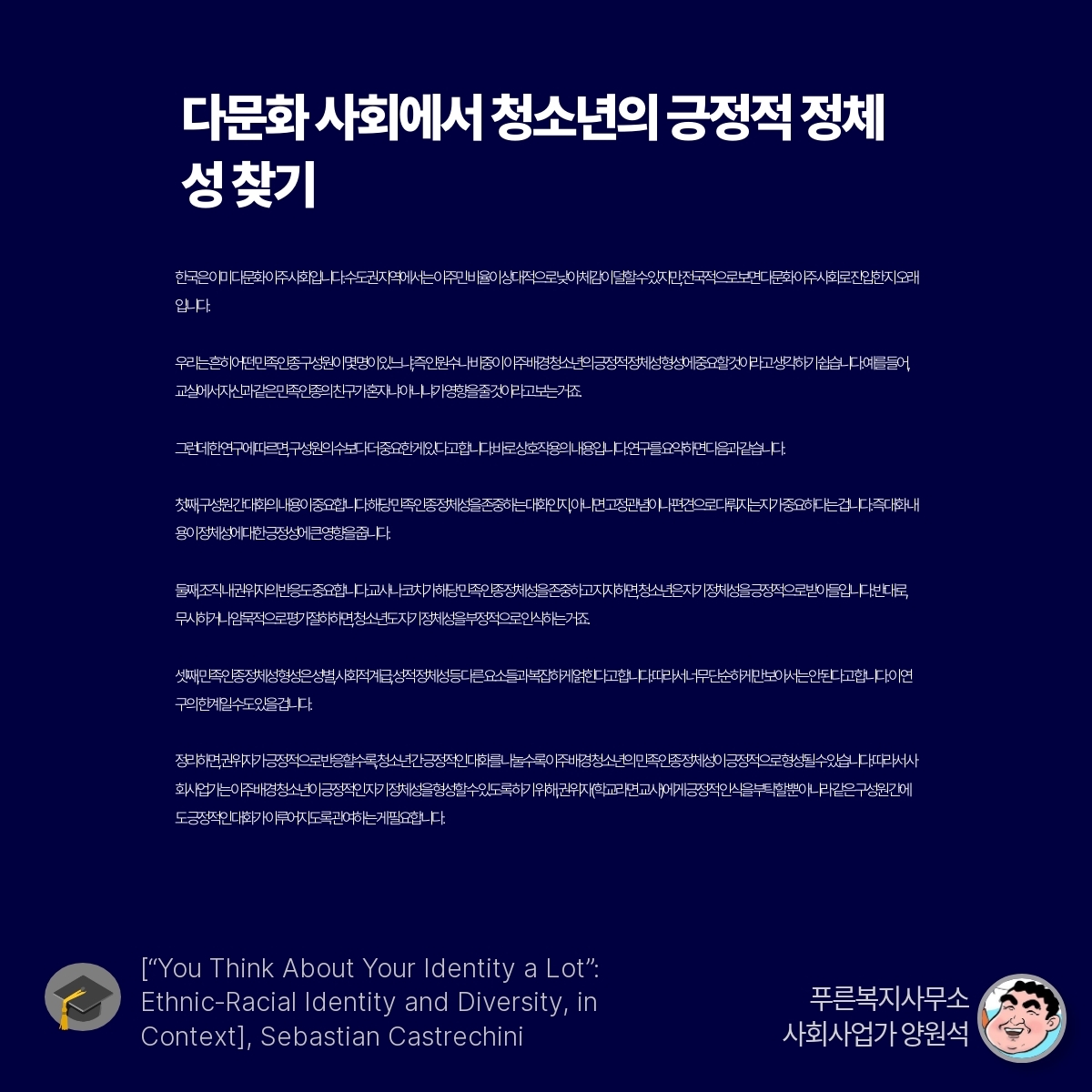
에디터 의견
한국은 이미 다문화 이주 사회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체감이 덜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다문화 이주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민족·인종 구성원이 몇 명이 있느냐, 즉 인원수나 비중이 이주 배경 청소년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자신과 같은 민족·인종의 친구가 혼자냐 아니냐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상호작용의 내용입니다.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성원 간 대화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해당 민족·인종 정체성을 존중하는 대화인지, 아니면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다뤄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대화 내용이 정체성에 대한 긍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둘째, 조직 내 권위자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교사나 코치가 해당 민족·인종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면, 청소년은 자기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무시하거나 암묵적으로 평가절하하면, 청소년도 자기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셋째, 민족·인종 정체성 형성은 성별, 사회적 계급, 성적 정체성 등 다른 요소들과 복잡하게 얽힌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무 단순하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한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권위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할수록, 청소년 간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수록 이주 배경 청소년의 민족·인종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사업가는 이주 배경 청소년이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위자(학교라면 교사)에게 긍정적 인식을 부탁할 뿐 아니라 같은 구성원 간에도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관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AI 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이 친구들과의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상호작용 속에서 민족-인종 정체성(ERI)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지를 살펴봅니다. ERI 연구에서 흔히 활용되는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배경 이상의 맥락을 탐색하고자 하며, 미국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토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백인 남성이 주도해왔지만, 소수 인종 청소년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을 가집니다.
연구 참여자는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8명이며, 다양한 인종(아시아계 미국인, 흑인, 라틴계, 백인), 성별(남성, 여성, 논바이너리)을 포함합니다. 연구는 사람들이 상호작용 중 자신의 인종적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ERI의 중대성)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의미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주요 결과는 청소년들이 속한 환경의 인종 구성뿐 아니라 상호작용의 내용—예를 들어 친구나 권위자의 반응—이 그들의 ERI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조직 내 권위자의 인정이나 무시는 청소년이 자신의 인종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ERI 발달을 논할 때 조직의 규범과 권력 관계, 특히 백인 우월주의를 강화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성별, 사회계층 등 기타 사회적 정체성과도 ERI를 함께 해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차정체성(intersectionality)을 반영하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