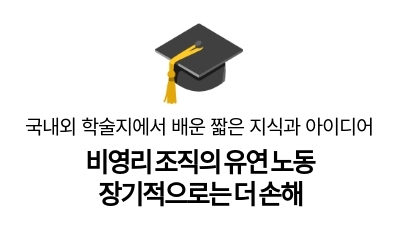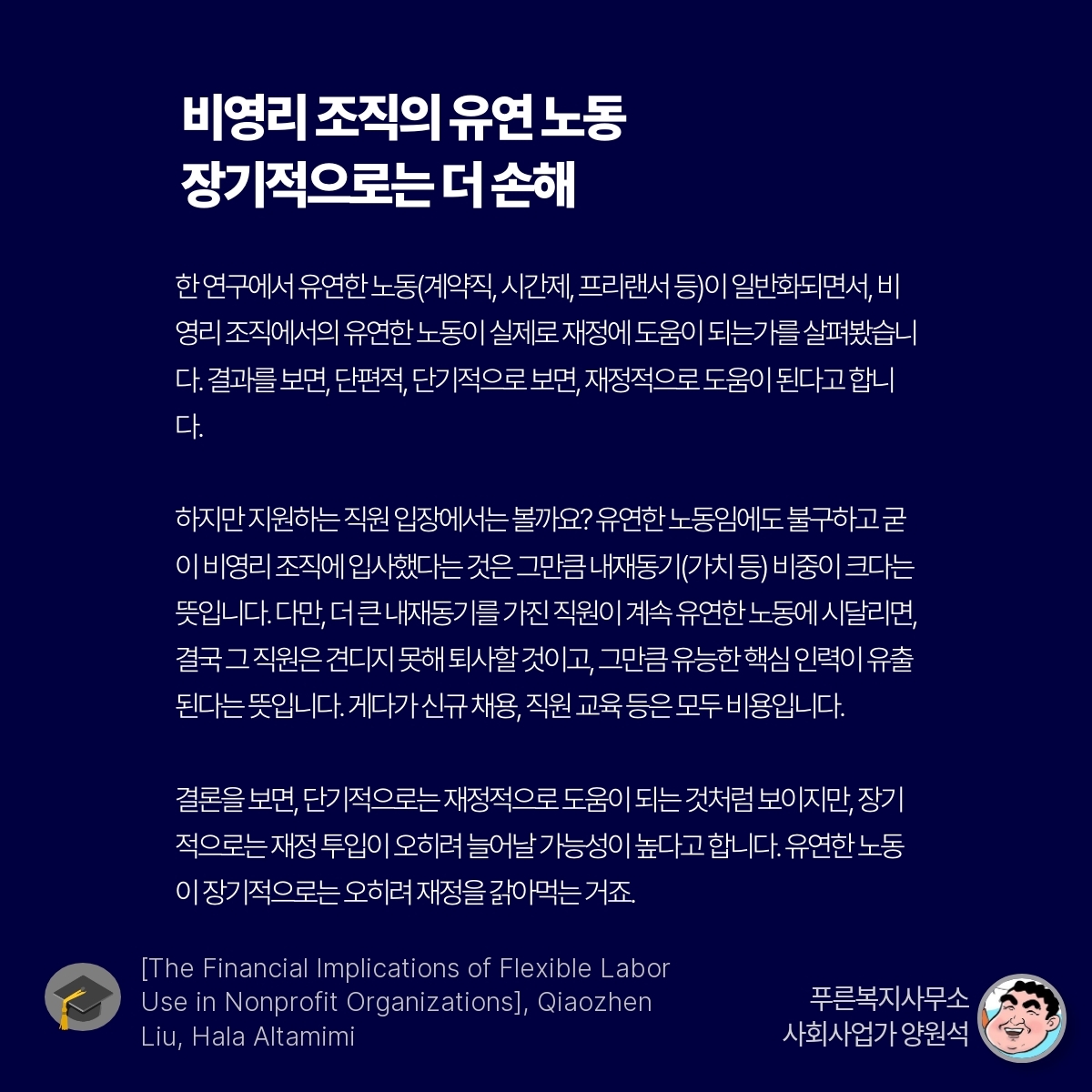
에디터 의견
한 연구에서 유연한 노동(계약직, 시간제, 프리랜서 등)이 일반화되면서, 비영리 조직에서의 유연한 노동이 실제로 재정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단편적, 단기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지자체는 이런 이유를 들어 유연한 노동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볼까요? 유연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영리 조직에 입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재동기(가치 등) 비중이 크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대우가 더 나은 영리의 유연한 노동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만, 더 큰 내재동기를 가진 직원이 계속 유연한 노동에 시달리면, 결국 그 직원은 견디지 못해 퇴사할 것이고, 그만큼 유능한 핵심 인력이 유출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에 따라 추가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신규 채용, 직원 교육 등은 모두 비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투입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유연한 노동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을 갉아먹는 거죠.
요즘 사회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단편적, 단기적, 단순하게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 그게 마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처럼요. 조금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정반대인데 말입니다. 다만, 이런 사고방식은 복지계에도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AI 요약
이 연구는 비영리 조직에서 ‘유연한 노동(계약직, 시간제, 프리랜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거예요. 미국의 예술·문화 비영리기관 데이터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했어요.
결과를 보면, 유연 노동을 활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성과에 뚜렷한 긍정적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장기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었죠.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기 구조로 설명했어요. 비영리 분야 종사자들은 돈보다 ‘가치와 사명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면 오히려 조직 충성도와 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