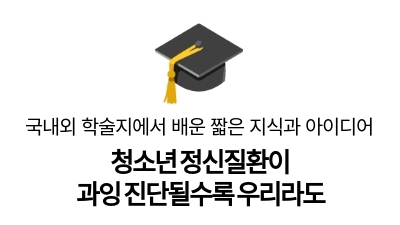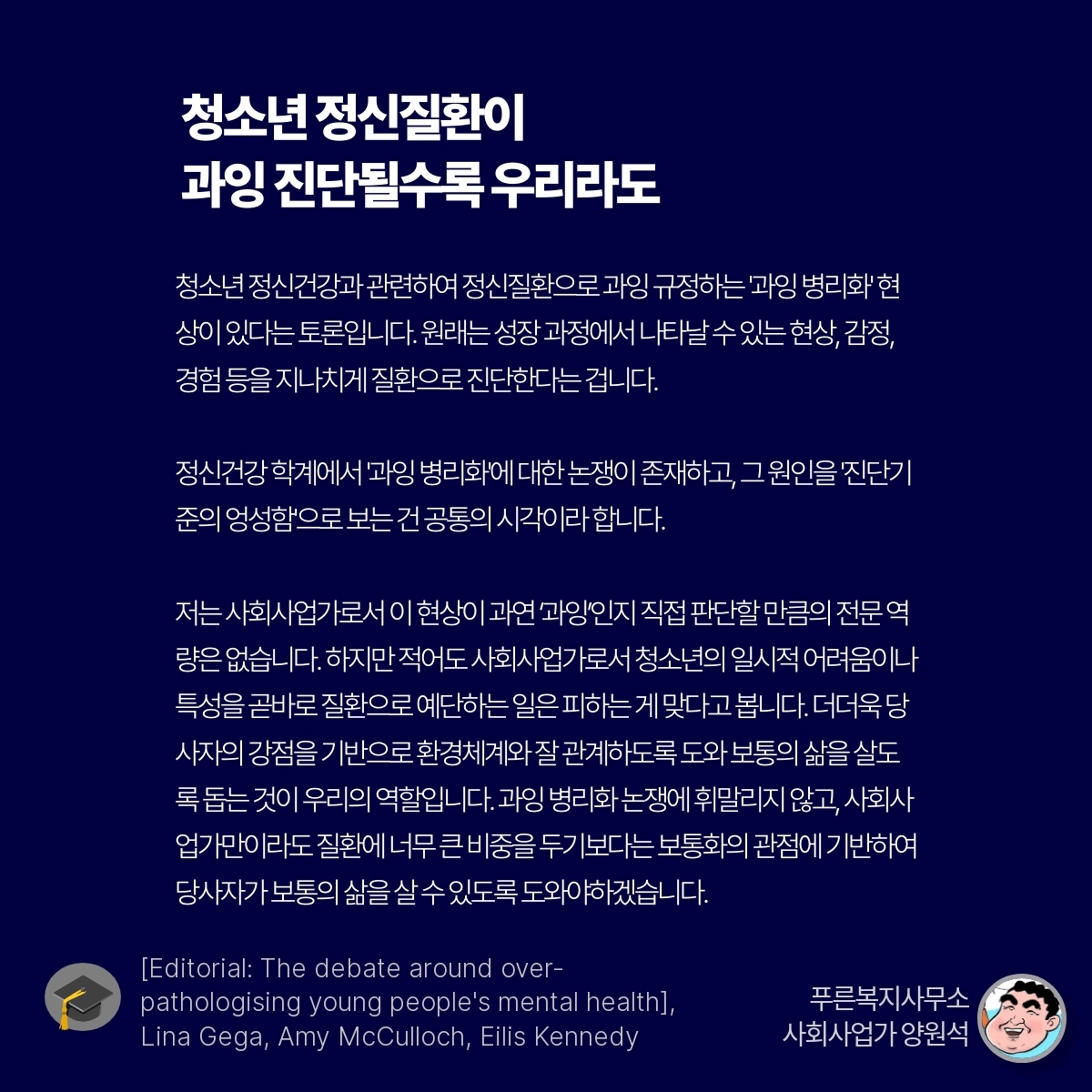
에디터 의견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으로 과잉 규정하는 ‘과잉 병리화’ 현상이 있다는 토론입니다. 원래는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감정, 경험 등을 지나치게 질환으로 진단한다는 겁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의미처럼 넓고 다양하게 보다보니 자연스럽게 자폐 진단이 꽤 많이 증가한 것처럼 정신질환 진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신건강 학계에서 ‘과잉 병리화’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고, 그 원인을 ‘진단기준의 엉성함’으로 보는 건 공통의 시각이라 합니다.
저는 사회사업가로서 이 현상이 과연 ‘과잉’인지 직접 판단할 만큼의 전문 역량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사업가로서 청소년의 일시적 어려움이나 특성을 곧바로 질환으로 예단하는 일은 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더욱 당사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환경체계와 잘 관계하도록 도와 보통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과잉 병리화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사회사업가만이라도 질환에 너무 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보통화의 관점에 기반하여 당사자가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하겠습니다.
AI 요약
이 논문은 요즘 청소년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과잉 병리화(over-pathologising)”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원래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험이나 감정을 지나치게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과잉 병리화란 무엇인가?
기존 진단 기준을 넓혀서 경미한 증상까지 질환으로 규정하는 것. 예를 들어, 일시적인 불안이나 사회적 어려움도 불필요하게 ‘불안장애’나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될 수 있음.
반대되는 주장: 여전히 진단이 부족하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진단·치료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진단을 회피하거나 모호한 용어로 대체하는 탓에, 청소년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SNS 등을 통해 자기 진단을 하는 현상이 나타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을 수 있다
필요한 아이들은 도움을 못 받지만, 반대로 일부는 너무 쉽게 진단을 받는 상황. 즉, 민감도(누구를 잡아내느냐)와 특이도(누구를 제외하느냐) 모두 낮은 ‘엉성한 검사’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해결 방향
진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불필요한 자기 진단과 낙인을 줄이는 방향 필요. 청소년의 실제 경험을 그들의 언어로 듣고, 필요할 때만 진단을 활용하는 접근.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활동도 ‘모든 힘든 경험 = 질환’이라는 식이 아니라 *보통화(normalising-보통화는 에디터가 직접 번역)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함.
‘보통화(normalising)’ 접근의 중요성
예를 들어, 불안은 누구나 새로운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임을 알려주는 것. 이런 접근은 불필요한 낙인과 병리화를 막고, 청소년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갖도록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