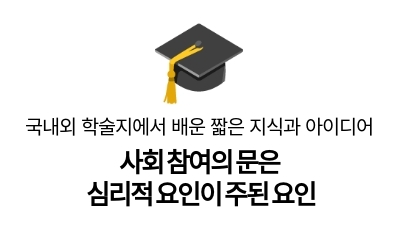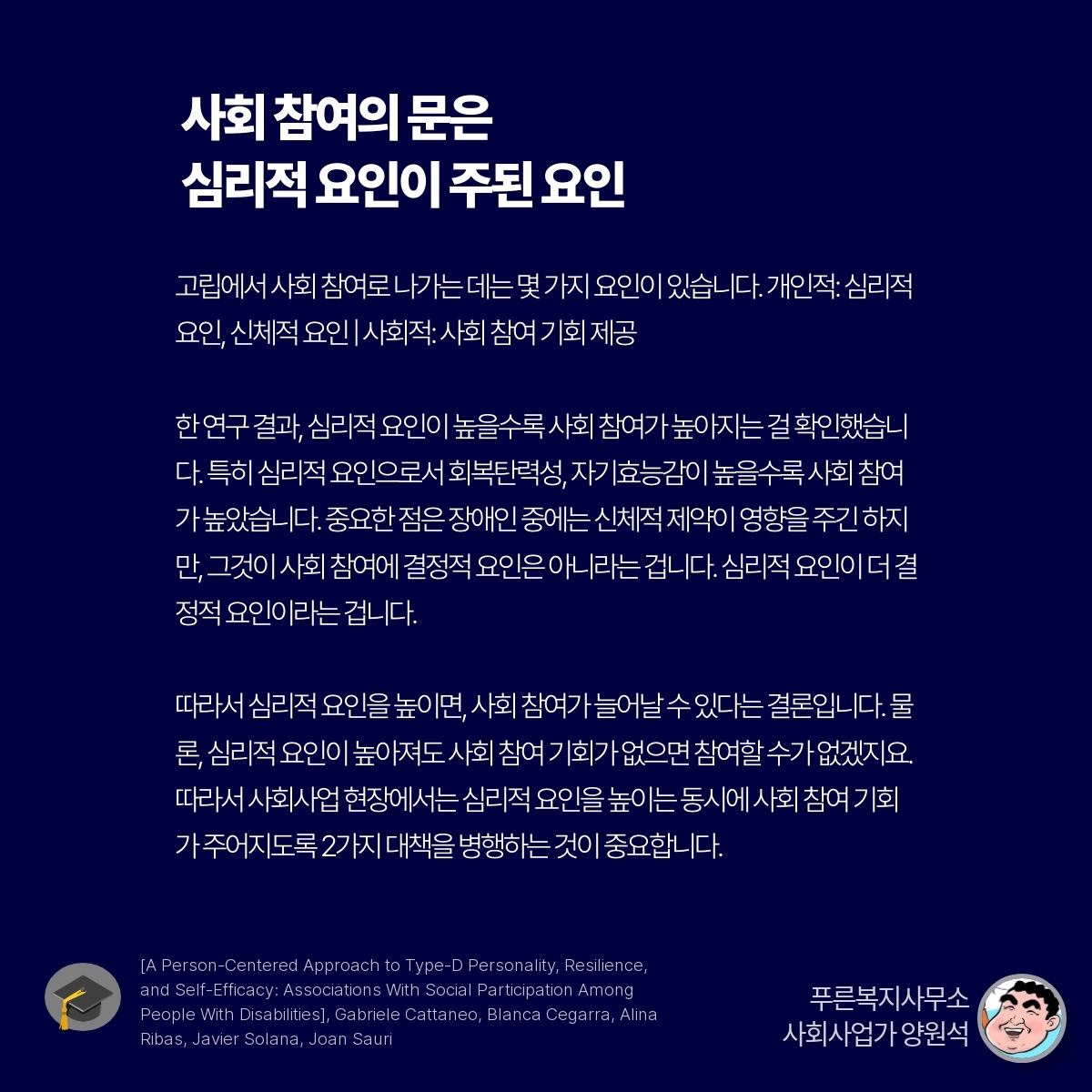
에디터 의견
고립에서 사회 참여로 나가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적: 심리적 요인, 신체적 요인 | 사회적: 사회 참여 기회 제공
한 연구 결과, 심리적 요인이 높을수록 사회 참여가 높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심리적 요인으로서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 참여가 높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심리적 요인이 높으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사회 참여가 높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즉, 장애인 중에는 신체적 제약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것이 사회 참여에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적 요인이 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심리적 요인을 높이면, 사회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심리적 요인이 높아져도 사회 참여 기회가 없으면 참여할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사회사업 현장에서는 심리적 요인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참여 기회가 주어지도록 2가지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런 결론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결과라는 것이고, 고립 가구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AI 요약
이 연구는 “심리적 특성이 사회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진 논문입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만족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제약 없이 참여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나요?
두 개의 장기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Barcelona Brain Health Initiative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Participa 코호트입니다.
어떤 도구로 사회 참여를 측정했나요?
‘USER-P’라는 도구를 썼어요. 이건 세 가지 영역을 측정합니다: Frequency of participation: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가 | Experienced participation restrictions: 참여하면서 얼마나 제약을 느끼는가 |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참여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심리적 특성은 어떻게 조사했나요?
세 가지 심리적 요인을 조사했습니다:
Type-D 성격: 부정적인 감정이 많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향
Resilience (회복탄력성):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어떤 사람 유형이 있었나요?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어요:
Risky: Type-D 성격이 높고, 회복탄력성과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
Neutral: 평균적인 성격과 심리 특성을 가진 사람
Protective: Type-D 성격은 낮고, 회복탄력성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 세 가지 유형은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Risky → Neutral → Protective 순서로 사회 참여 수준이 점점 높아졌어요.
장애 여부, 나이, 성별 같은 일반적 특성 외에도, 심리적 특성 자체가 사회 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확실히 더 높은 수준의 사회 참여를 보였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참여 수준이 낮았어요.
왜 이 연구가 중요할까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사회적 고립과 참여 저조는 단지 ‘신체적 제약’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 특성, 특히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면 사회 참여도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부분을 개입 포인트로 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