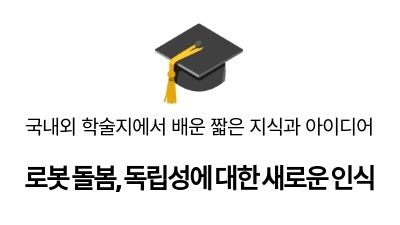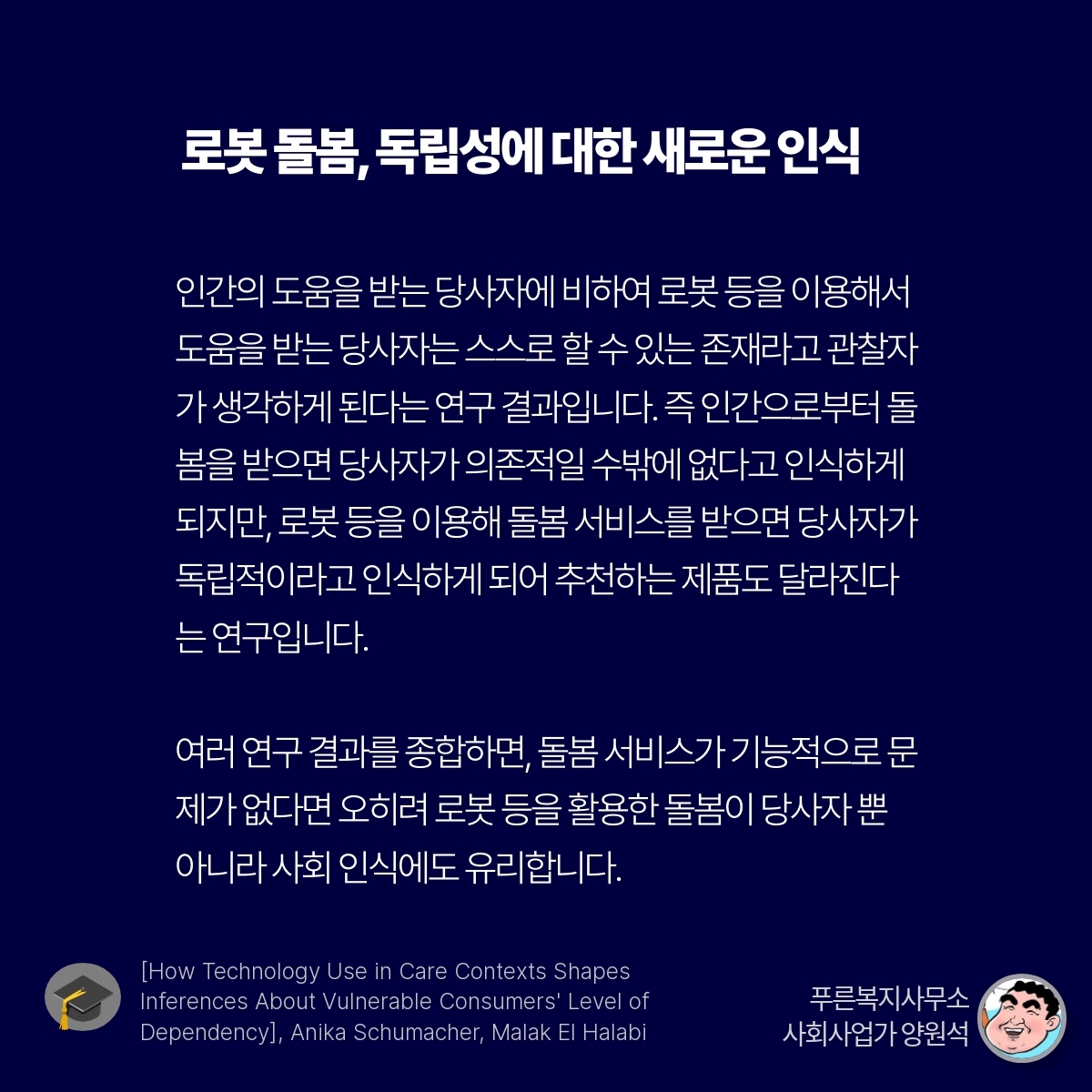
에디터 의견
인간의 도움을 받는 당사자에 비하여 로봇 등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당사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관찰자가 생각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즉 인간으로부터 돌봄을 받으면 당사자가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게 되지만, 로봇 등을 이용해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당사자가 독립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추천하는 제품도 달라진다는 연구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돌봄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로봇 등을 활용한 돌봄이 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 인식에도 유리합니다.
AI 요약
이 논문은 **’기술로 돌봄을 받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물건을 골라주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누군가가 돌봄을 받고 있는 장면을 봤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돌봄이 사람(예: 요양보호사)이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나 기술(예: 로봇, 앱, 자동기기)이 해주는 것인지에 따라 보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이 도와주는 장면을 보면 → “아, 이 사람은 많이 의존적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계가 도와주는 장면을 보면 → “오? 이 사람은 좀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같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 즉, 기술이 돌봄에 사용되면, 관찰자들이 그 사람을 덜 의존적인 사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이 인식의 차이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사주거나 추천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은 많이 의존적이야’라고 느껴지면 →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물건(utilitarian) 위주로 고르게 돼요. 예: 보조도구, 기능성 식품, 안전한 신발 등
‘이 사람은 꽤 자립적이야’라고 느껴지면 → **기분 좋고 즐거운 물건(hedonic)**도 고르게 돼요. 예: 간식, 향초, 예쁜 옷, 즐거운 활동용품 등
예를 들면?
A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식사해요. →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네”라고 생각 → 실용적인 것만 챙겨줌
B 어르신은 로봇 보조기로 식사해요. → 사람들은 “오, 이 분은 꽤 독립적이네”라고 생각 → 즐거움도 줄 수 있는 선물이나 물건도 챙겨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