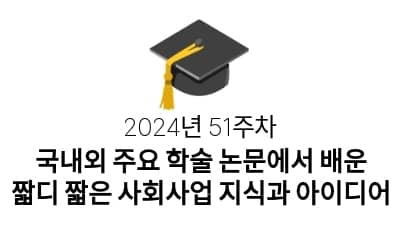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와 활동이 홈리스 및 취약 주거인의 사회적 자본(신뢰, 연결, 규범 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캐나다의 세 도시에서 4년간 855명의 홈리스 및 취약 주거 상황에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주거 안정성이 곧바로 사회적 자본을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가 안정된다고 바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주거 안정성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결과로 주거 안정성 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통합이 홈리스 및 취약 주거인들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회사업은 관계가 핵심입니다. 논문에서 언급한 주거 안정, 사회적 지원, 심리적 통합 중에서 사회사업은 사회적 지원 즉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입니다. 사회사업이 주거 안정을 직접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주거 안정이 더 큰 효과를 내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한 논문 : The role of housing stability in predicting social capital: Exploring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integration as mediators for individuals with histories of homelessness and vulnerable housing, Ayda Agha, Stephen W. Hwang, Anita Palepu, Tim Aubry
이 연구는 문헌 검색을 통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미국의 원주민 참가자를 대상으로 문화 치료 방식을 적용한 42개의 연구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호주 원주민은 유럽 식민지를 거치면서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문화 차이로 인해 서구 치료 방식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즉 토착 문화, 토착 지식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식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화 치료 방식’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사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사업가가 지역의 문화와 토착 지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지런히 다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교수님보다 더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하고, 현장 사회사업가가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Healing and wellbeing outcomes of services for Aboriginal people based on cultural therapeutic ways: A systematic scoping review, Sarah Wise, Amanda Jones, Gabrielle Johnson, Shantai Croisdale, Caley Callope, Catherine Chamberlain
이 연구는 2018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541명의 청소년을 표본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부정적 양육 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이고, 공격성과 우울 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를 순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부정적 양육 태도 → 스마트폰 의존도 → 우울 증상
부정적 양육 태도 → 스마트폰 의존도 → 공격성 → 우울 증상
개인적으로는 부정적 양육 태도로 자녀가 스마트폰에 의존할수록 다시 양육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그러면 연구결과처럼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는 양의 되먹임이 작동할 거 같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막을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갖추는 경로로 접근하는 것이 더 근본책으로 보입니다.
Sequential Dual Mediating Effects of Smartphone Dependence and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Sarah Wise, Amanda Jones, Gabrielle Johnson, Shantai Croisdale, Caley Callope, Catherine Chamberlain
지금까지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어떻게 양육을 잘 할 것인가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비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호주의 연구 결과, 양육하는 조부모는 비양육자에 비하여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제약 등이 저조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주당 40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특히 할머니는 더 삶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사업가를 통한 사회적 모임 및 관계 향상 그리고 간호사 등을 통한 건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조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잘하도록 도울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양육을 하는 조부모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 봅니다.
Well‐being of grandparent kinship caregivers: An umbrella review, Sarah Wise, Amanda Jones, Gabrielle Johnson, Shantai Croisdale, Caley Callope, Catherine Chamberl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