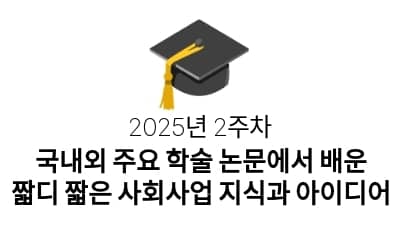본 연구에서는 사건적(emotional) 감정과 본질적(integral) 감정이 창의적인 은유 생성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탐구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기쁜(슬픈) 비디오를 본 참가자들이 동일한 감정 경험을 표현할 때 가장 창의적으로 은유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즉, 감정이 일치할 때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논문을 읽고 든 생각은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의 감정에 공감할 때, 당사자를 돕는 것도 더 창의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가슴이 움직여야 머리가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연구를 미루어 보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의 상황에 깊이 공감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비로소 머리가 돌아가며 더 창의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한 논문 : The interactive effect of integral and incidental emotions on creative metaphor performance, Xingwen Liu, Haiying Long, Weiguo Pang
이 연구는 어린 시절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경제적 어려움, 예측 불가능성, 낮은 부모의 민감성, 유해한 아동 경험)이 부모의 ‘감정 조절’ 및 ‘마음 읽기(mentalizing)’ 능력에 미치는 연관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부모의 어려움이 자녀에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562명의 3세에서 6세 자녀를 둔 부모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부모가 어린 시절에 1.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자주 처하고, 2. 당시 부모가 둔감하게 양육을 하면, 나중에 커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1.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2. 자녀의 마음 읽기를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세대 전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대 전이를 예방하려면, 부모가 1.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도록 돕고, 2.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한 논문 : Parental childhood adversity and emotional functioning: Associations with child’s emotion regulation, Ghadir Zreik, Iris Haimov, Ohad Szepsenwol
항우울제는 치매 환자의 행동 및 심리적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주 처방되지만,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이래로 항우울제가 치매 환자의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7개의 무작위 대조군을 분석하였고, 그 중 5개는 항우울제가 위약에 비해 불안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치매 환자의 심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우울제가 자주 처방되지만, 위약(가짜약) 대비하여 불안 개선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결국 치매 환자에게는 비약리적 접근을 우선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참고한 논문 : What is the Evidence for Using Antidepressants to Reduce Anxiety for People with Dementia?, Mr Joe Bingley, Dr Amanda Young, Dr Terence WH C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