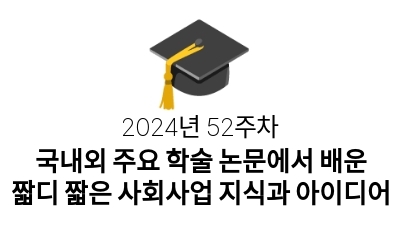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중간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6.95달러(약 1만 원, 2024.12.20 현재) 미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빈곤에서 거의 벗어난 한국에서 살다보면 부유하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지만, 세계 인구의 생활비 수준과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간 빈곤(moderate poverty)은 UN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하루 $6.95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
참고한 논문 : Introducing Sustainable Livelihoods: Why They are Needed – and How to Manage Them, Veronica Hopner, Stuart C. Carr
이 논문은 직원의 재정적 불안정성이 조직에 미치는 위험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직원에게 재정적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직원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직원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면, 직무 수행이나 조직에 대한 헌신, 그리고 전반적인 직원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논문을 살피면서 드는 생각은 보조금을 받는 복지기관은 직원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겁니다.
복리후생 확대 : 유연 근무, 자녀 돌봄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 지출을 간접적으로 지원.
심리적 자원 강화 : 유연한 근무 환경과 직업 안정성을 통해 직원의 통제감을 회복시키고, 건강 문제를 지원
결국 복지기관은 내적 동기를 높이는 데 주력하되, 외적 동기는 간접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한 논문 : Providing financial security to workers pays off: On the risks of employee financial insecurity for organisations and how to control them, Eva Selenko, Katharina Klug, Jean-Yves Gerlitz
이 연구는 환경 지식이 건축 디자인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에너지 건축’ 석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환경 지식이 통합될수록 학생들의 디자인 창의성이 저하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환경 지식은 기술적 측면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럴수록 디자인의 독창성과 미적 가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하면, 너무 기술적인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청하면, 이것이 창의적 접근을 제한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사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사회사업가에게 ‘이걸 고려해야 한다’, ‘이건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너무 기술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면, 창의성은 발휘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참고한 논문 : The impact of environmental knowledge on the creativity of architectural designs: A study on master of “Energy in Architecture” students in Iran, Hamid Kashefiyeh, Hamed Beyti, Leila Medghalchi, Farzin Haghparast